|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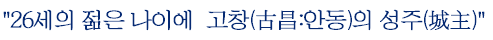 |
|
安東金의 始祖 太師公은 신라종성(宗姓:왕실의 성) 金이며 휘(諱:이름) 선평(宣平)이다.
신라 효공왕 5년 흥덕궁에서 태어나셨고, 공은 봉의 눈과 용의 수염, 별의 정기와 호랑이의 위엄을 갖추었다.
춘추 26세에 고창(古昌: 안동)의 성주(城主)가 되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지리상 중요 성(城)에 26세의 젊은 성주였다면 필시 진골(眞骨)이었을 것이니 효공왕의 왕자(王子)로 추정된다. 신라말 경애왕때 고창군(古昌郡: 안동)의 성주(城主)로 서기 927년(신라 경순왕 원년)에 후백제의 견훤이 신라 경애왕을 살해하자, 930년(경순왕 4)에 권행(權幸:안동권의 시조), 장정필(張貞弼:안동장 시조)과 함께 향병(鄕兵)을 모으고 왕건을 도와 고창(안동)군에서 후백제(後百濟)의 견훤군(甄萱軍)을 토벌하여 병산대첩(甁山大捷)의 전공을 세웠다.
왕건이 고려(高麗)를 개국할 무렵 그 전공으로 城主 김선평공은 대광(大匡), 권행과 장길은 대상(大相)벼슬을 받았고 [三韓壁上功臣三重大匡師亞父]의 관작칭호를 받았다. 安東金은 이 때부터 본관(本貫)을 안동(安東)으로 하였다.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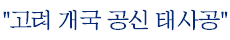 |
|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원년(918) 8월 辛亥일에 공(功)을 표시(表示)하며 "그 폭주(暴主)를 폐할 때를 당하여 충신의 절(節)을 극진히 하는 자는 마땅히 상뢰를 행하여 훈노(勳勞)를 추장(推裝)하여야 되는 것이다"하고 당시 성주(城主) 휘(諱) 선평(宣平)을 安東金씨의 始祖로 공신에 정하고 고창(古昌)을 안동부(安東府) 승격시켰다.
태조13년(930) 12월 겨울에는 신흥사(新興孝)를 중수(重修)하고 공신당(功巨堂)을 설치하여 삼한공신(三韓功臣)을 동서벽에 도화하였는데(壁上公臣) 그 수는 29명에 달하였다고 하며 그 명단에 시조 太師公의 초상화가 배치되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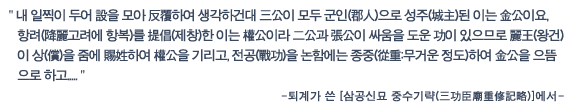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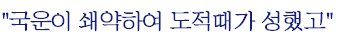 |
|
신라 말엽 당시 신라는 국운이 쇠약하여 곳곳에서 도적떼가 성했고, 특히 옛 백제 땅에서는 견훤이 후백제를 세우고 옛 고구려 땅에서는 고려가 일어나 날로 세력이 강성하였다. 927년(경애왕 4년) 포악한 견훤은 마침내 군사를 이끌고 경주까지 쳐들어와서 왕을 자살케 하고 왕비를 능욕하며 재물을 함부로 빼앗아 그 피해가 막심하였으나 힘이 약한 신라로서는 막을 수가 없었다. 이 소식을 들은 고려 태조 왕건은 군사 5천명을 이끌고 구원하러 왔으나 오히려 대구 부근의 공산 동수싸움에서 대패하여 신숭겸, 김락 등 많은 장수와 군사를 잃은 채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돌아갔다.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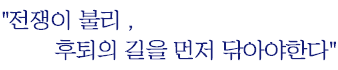 |
|
 고려 태조 12년 견훤은 승승장구한 여세를 몰아 의성, 풍산 등의 여러 고을을 빼앗고 안동을 공격하여 왔다. 10년전 대구 공산싸움에서 패한 이후 군사를 기르며 때를 기다리던 고려 태조도 이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남하하여 안동에서 고려와 후백제의 두 군사는 생사를 건 대 전투에 임하게 되었다. 고려 태조 12년 견훤은 승승장구한 여세를 몰아 의성, 풍산 등의 여러 고을을 빼앗고 안동을 공격하여 왔다. 10년전 대구 공산싸움에서 패한 이후 군사를 기르며 때를 기다리던 고려 태조도 이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남하하여 안동에서 고려와 후백제의 두 군사는 생사를 건 대 전투에 임하게 되었다.
이듬해 1월 예안에 주둔하고 있던 고려군은 안동 북쪽의 병산(甁山:안동시 와룡면 소재)에 진을 치고 후백제군은 맞은 편의 석산(안동시 와룡면 소재)에 진을 치고 대치하였다. 지금까지 승리를 거듭한 견훤의 군대는 병력도 많고 사기도 충천하였으나 고려 태조의 군대는 그렇지 못하였으니 대상(大相) 홍유 같은 이도 전쟁이 불리하면 후퇴할 길을 먼저 닦아야 한다고 태조에게 진언할 정도였다.
당시의 고창(안동의 옛이름) 성주이던 김선평(金宣平)과 권행(權幸), 장길(張吉) 세 분은 일신의 안전만을 위한다면 마땅히 견훤에게 항복하는 것이 옳겠으나 돌아가신 경애왕의 원수를 갚을 좋은 기회로 알고, 또 포악무도한 견훤으로부터 이 고장을 수호하기 위하여 고려 태조에게 협조하기로 결정 하였다. 이에 고려 태조는 크나 큰 힘을 얻게 되었고, 이 고장 지리에 밝은 세 분 태사는 강대하고 사나운 견훤의 군사와 정면 대결을 하여서는 승리하기 어려움을 알고 고을민을 이끌고 고려 군대와 힘을 합하여 저수봉(猪首峰:현 안동시 뒷산)으로부터 밤중에 견훤의 군을 뒤에서 습격하였다. |
|
 |
|
 |
|
 때를 맞추어 고려 태조가 군사를 이끌고 정면에서 진격하니 견훤은 견디지 못하고 8천명의 군사를 잃은 채 패주하고 말았다. 이로부터 고려의 병력은 날로 강성해지고 청송을 비롯한 안동 주위의 30여 고을과 동해 연안의 여러 고을 등을 합하여 100여 고을이 모두 고려에 귀순하였다. 고려 태조(왕건)는 이 병산싸움에서 큰 공을 세운 세 분 태사의 공로를 높이 치하하여 선평은 대광(大匡), 권행(權幸)과 장길(張吉)은 대상(大相)을 삼고 태사(太師)의 벼슬을 내렸다. 때를 맞추어 고려 태조가 군사를 이끌고 정면에서 진격하니 견훤은 견디지 못하고 8천명의 군사를 잃은 채 패주하고 말았다. 이로부터 고려의 병력은 날로 강성해지고 청송을 비롯한 안동 주위의 30여 고을과 동해 연안의 여러 고을 등을 합하여 100여 고을이 모두 고려에 귀순하였다. 고려 태조(왕건)는 이 병산싸움에서 큰 공을 세운 세 분 태사의 공로를 높이 치하하여 선평은 대광(大匡), 권행(權幸)과 장길(張吉)은 대상(大相)을 삼고 태사(太師)의 벼슬을 내렸다.
 또 태조는 원래 경주 金씨인 세분에게 선평은 金, 행은 權, 길은 張씨의 성을 내려 주고, 고창군을 안동부(安東府)로 승격시켜 삼태사의 식읍(食邑)으로 삼게 하였다. 그 후 이 고을 군민들은 삼태사의 크신 덕을 추모하여 사당을 직소, 해마다 봄, 가을에 제사를 받들었다. 또 태조는 원래 경주 金씨인 세분에게 선평은 金, 행은 權, 길은 張씨의 성을 내려 주고, 고창군을 안동부(安東府)로 승격시켜 삼태사의 식읍(食邑)으로 삼게 하였다. 그 후 이 고을 군민들은 삼태사의 크신 덕을 추모하여 사당을 직소, 해마다 봄, 가을에 제사를 받들었다.
현재 삼태사의 사당인 태사묘(太師廟)는 안동시 북문동에 있고 墓所는 안동시 서후면에 있다.
태사묘(太師廟)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3shrine.andong.com 참고 태사묘는 기차역과 버스역의 5분거리에 있다. 어른들의 휴식장소로도 이용되며 방문하면 항상 문중의 어른들을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 전 화: 김씨문중 054-857-7683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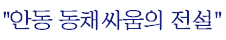
후백제 견훤이 신라를 멸한 여세로 안동에 진격했을 때 당시의 성주 김선평(金宣平), 형관 권행(權幸), 장길(張吉) 세 사람이 향토민 전체와 고려 왕건에 합세하여 인해전술로 견훤군을 섬멸하였고, 동채싸움은 이 싸움에서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놀이를 면면히 전승하여 왔다고 한다.
동채싸움에 얽힌 또 다른 전설은 다음과 같다
지렁이가 화(化)한 견훤이 안동으로 쳐들어 왔다. 이를 안 삼태사(三太師)는 지렁이를 물리칠 궁리를 하다가 동채를 만들어서 견훤이 진을 치고있는 병산(안동북쪽 와룡)으로 나아갔다. 이 때 견훤은 마침 지렁이로 변하여 강가 모래벌에서 뒹굴고 있었다. 견훤을 잡을 수 있는 썩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삼태사는 지렁이를 몰아 넣어서 두 동채머리 사이에 끼워 죽였다. 견훤을 물리치던 동채싸움이 하나의 풍속이 되어서 정월 대보름날이면 동채를 만들어서 지렁이를 잡던 식으로 싸움을 한다고 전한다. 동채싸움에서는 향토방위를 다지는 희생정신과 규율을 엄수하며 협동 단결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 현재 동채싸움은 중요 무형문화재 제24호(1969.1.1)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명칭이 "안동차전놀이"로 되어 있다.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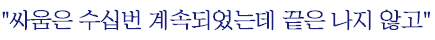 |
|
견훤은 원래 지렁이의 화신이었다고 한다. 전시에는 모래땅에 진을 치고 신변이 위태롭게 되면 지렁이로 변해 모래속으로 들어가버려 웬만해선 그를 물리칠 수 없었다고 한다. 삼태사(왕건과 견훤간의 전투시 왕건을 도운 권행, 김선평, 장길 등 고려 건국공신)가 왕건을 도와 현재의 안동시 와룡면 서지리에 진을 치고 있을 때 견훤은 그 동쪽 낙동강변 모래땅에 진을 쳐 대전하였다. 싸움이 수십 번 계속되었는데 끝이 나지 않고 견훤은 싸움을 하다 불리해지면 모래속으로 기어들어가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에 삼태사들은 전략을 세워 흐르는 강을 막아 못을 만들어 못 속에 소금을 수없이 넣어 염수를 만들어 놓고 접전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싸움이었다. 견훤은 점점 불리해지자 당황하여 지렁이로 둔갑하더니 모래속으로 기어들어갔다. 삼태사는 이때다 하며 염수의 못물의 터트렸다. 소금물이 흘러 내리니 아무리 둔갑한 지렁이일지라도 견딜 재주가 없었다. 견훤은 겨우 목숨만 건져 패주하여 안동땅에서 물러났다고 한다. |